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나오는 '슬견설(蝨犬說)'이다. 학창시절 이 글을 읽고 작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옛 글에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글 속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사람이나 큰 짐승들만 죽음을 두려워 한다 여겼을 뿐, 미물이라 불리는 작은 생물들의 목숨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때였다. 그러나 학창시절 이 글에 감동하던 것과 별개로, 그때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모기를 잡고, 파리를 내쫓고, 더러는 먼지다듬이도 휴지로 쓱 해치운다. 거기엔 항상 '해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나름의 구실이 붙는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들이 이렇게 작은 곤충이나 벌레같은 미물에만 가학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가끔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를 사살할 때도 가책같은 건 없다. 밤길에 고라니를 치었어도,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이라 위안하며 꺼져가는 생명을 그대로 두고 갈 길을 간다. 멧돼지가 꼭 먹이가 부족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멧돼지나 고라니나 인간들에 의해 바뀐 길을 찾지 못 하고 헤매다 인간의 구역에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다. 내가 산 내 아파트니 내꺼고, 내 아파트 앞에 멧돼지가 나타난 건 내 구역에 야수가 침범한 것이니 해충인 파리나 모기처럼 당연히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자신의 구역을 빼앗긴 것은 멧돼지나 고라니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생태계 연결 통로(Eco-Bridge) 같은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건 동물들에 대한 배려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 양심인 셈이다.
달팽이의 뿔과 소의 뿔을 같이 보고, 메추리를 큰 붕새와 같이 보고 나면 도에 대해 이야기 하겠노라는 이규보의 말은, 생명의 경중에 있어 인간이나 새 한 마리, 곤충 하나의 생명이 다르지 않음을 전제해야 그 진정한 가치가 보인다는 뜻이다. 부지불식간에 밟아 죽인 개미 한 마리의 생명이나, 고귀하다 여겨지는 인권을 가진 인간의 생명이, 결국은 태어나 소멸하는 모든 것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것이다.
이규보는 고려 무신정권 시대에 문신으로 살다간 사람이다. 문신을 제거하고 무신의 세상을 만드는 데 성공한 무신들에게도 이규보와 같은 당대의 인재는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권에 기대 살고 있는 간당거리는 자신의 처지가 마치 뭔가에 눌린 벌레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도 같다. 그가 태평성대의 승승장구한 벼슬아치였다면 그 시절에 한갖 미물에 관심이나 가졌을까, 어린 나이에 벌써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속 동명왕편을 재해석해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다시 쓰고자 <동국이상국집>을 쓴 잘난 그 아니었던가.
'책..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래된 책 속의 '오래된 서적' (4) | 2016.09.23 |
|---|---|
| 이화에 월백하고... 센티멘탈리즘의 정제 (2) | 2016.09.13 |
|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라 (4) | 2016.09.05 |
| 현진건의 <고향> 속 일제의 수탈과 간도 이주 (2) | 2016.08.31 |
| 꽃을 먹는 아이들- <마사코의 질문>中 (2) | 2016.08.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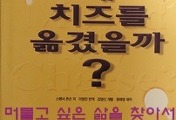


댓글